


우리나라 국가표준식물목록(이하 국표식으로 약칭)에 과거 초창기에는 1980년 발간된 이창복박사의 대한식물도감에 근거하여 튜울립나무속 튜울립나무라고 등록하였다가 나중에 속명은 튜울립나무속으로 그대로 둔 채 종명만 이영노박사의 1996년 원색한국식물도감에 근거하여 튤립나무로 변경한 학명 Liriodendron tulipifera인 목련과(科) 외래종으로 키가 30m도 넘게 자라는 대교목이 있다. 종소명 tulipifera가 튜립 꽃이 핀다는 뜻이므로 국명을 튜울립나무라고 하다가 튤립나무로 한글 표기를 변경한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2013년에 무슨 이유인지 튤립나무를 백합나무로 종명을 변경한다. 그렇게 되어 속명은 튜울립나무속이고 종명은 백합나무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학명 Liriodendron tulipifera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속명 Liriodendron는 Lirion(lily) + dendron(tree) 즉 백합나무라는 뜻이고 종소명 tulipifera는 ‘튜립이 핀’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백합나무속에 튤립 같은 꽃이 피는 종이 되므로 속명이 백합나무속이 되어야 하고 종명이 튤립나무가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실제 이 나무의 꽃을 본 사람이라면 튤립꽃을 연상하지 백합꽃을 닮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튤립나무로 제대로 되어 있던 이름을 구태여 백합나무로 국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나 하면서 우리나라 국표식의 무원칙을 아쉬워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고 있었는데 2019년에 속명도 튜울립나무속에서 백합나무속으로 변경하여 이제는 백합나무속 백합나무가 되었으므로 일견 일관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리고 속명 자체가 Liriodendron 즉 백합나무이므로 이를 백합나무속이라고 수정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수정하고 보니 종소명 tulipifera는 분명 튤립 파생어인데도 백합나무라고 하는 것이 못내 어색해 보인다. 식물을 잘 모르는 사람도 백합과 튤립은 구분하는데 우리나라 국표식 담당자들은 도대체 백합과 튤립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 Liriodendron tulipifera는 미국 동부가 원산지이지만 유럽은 물론 한중일 3국 등 전세계 온대지방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수종인데 이 나무를 백합나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단 두 나라뿐인 것 같다. 서양에서는 모두 한결같이 tulip tree라고 하며 중국에서는 나무의 잎이 거위 발바닥을 닮았다고 아장추(鹅掌楸)라고 부르는 중국 자생종에 대응하는 북미아장추(北美鹅掌楸)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를 엉뚱하게 백합목(百合木)이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이름이 튤립나무에서 백합나무로 바뀐 연유가 자명해 진다. 외래종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합당한 이름을 붙일 생각은 안하고 우리 식물학계에서 그저 ‘무조건 일본 따라하기’만 하는 또 하나의 사례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씁쓸하다.
이 나무의 꽃은 절대 백합의 꽃을 닮았다고 할 수는 없다. 말이 나왔으니 여기서 백합과 튤립에 대하여 알아 보자. 영어 Lily에 상응하는 백합(百合)은 중국에서 온 한자어이고 순수 우리말은 나리이고 일본에서는 이를 가는 줄기에 큰 꽃이 달려 있어서 바람에 흔들린다고 그런 뜻의 한자어 요(揺)에서 파생되어 유리(ユリ)라고 하지만 한자로는 백합(百合)으로 표기한다. 원래 백합은 백합과(Liliaceae) 백합속(Lilium) 식물들을 통칭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백합속 식물들을 닮은 백합과(科) 다른 속의 일부 식물들도 lily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한중일도 모두 대체로 비슷하다. 하지만 서양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에는 그냥 lily나 백합(百合) 또는 유리(ユリ)라는 특정 식물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만과 일본 류큐열도가 원산지인 백합과 백합속 학명 Lilium longiflorum인 특정 구근식물을 백합이라고 국표식에 버젓이 등록하고 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인가? 식물에 귀천이 없다지만 식물분류체계상 백합이란 백합속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백합속은 백합과 백합목 나아가서는 백합강의 모식속이므로 종가 중 종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나라 자생종 나리들을 제쳐두고 일본과 대만원산의 나리를 뼈대 있는 백합가문의 종손 중 종손으로 삼은 것이다. 그것도 일본과 중국에서는 이를 백합이라고 대접하여 부르지도 않고 아주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을 말이다.



우리가 그냥 백합이라고 부르는 Lilium longiflorum의 중국명은 사향백합(麝香百合)이며 일본명은 철포백합(鉄砲百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중에서도 이 구근식물의 이름이 철포백합인 줄 아는 사람들이 무지 많으며 실제로 백합을 구입하려면 화원에 가서 철포백합이라고 해야 통한다. Lilium속에는 우리 자생종으로 참나리 하늘나리 중나리 말나리 솔나리 등 엄청 예쁜 꽃들이 많은데 이들 중 하나를 백합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그냥 속명으로만 두던지 했어야 마땅하다. 게다가 이미 1949년 정태현선생이 ‘조선식물명집’에서 참나리에다가 백합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9년 이창복선생이 ‘우리나라의 식물자원’에서 일본산 철포백합에다가 백합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을 정명(추천명)으로 인정하고 말았다. 그래서 서양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중시하는 Madonna lily 즉 성모의 백합이라고 불리는 백합속의 모식종인 Lilium candidum가 백색 꽃이 피는 데다가 우리가 정명 백합이라고 부르는 이 일본산 철포백합(鉄砲百合)도 크고 흰 꽃을 피우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합이 마치 백색(白色) 꽃이 피는 나리인 줄로 잘못 알고 있다. 그건 절대 아니다. 백합(百合)의 어원은 중국에서도 설왕설래하지만 그 중에는 백(白)색 구근이 인편(鳞片) 즉 비늘조각 백(百) 개가 합(合)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과 서로 감싸고 있는 인편의 모양이 마치 연꽃과도 같아서 백년호합(百年好合) 즉 평생토록 화목하다는 뜻에서 왔다는 설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여하튼 중국에서 백합이라는 약재로 많이 쓰이는 구근 중 하나인 우리 자생종 참나리의 중국명은 붉은 색 꽃잎이 말렸다고 권단(卷丹)백합이라고 하며 그 외에도 우리 말나리는 동북백합(東北百合)이며 솔나리는 꽃이 처진다고 수화백합(垂花百合)이라고 하므로 백합을 백색 꽃으로만 인식해서는 절대 안 된다.


반면에 tulip 즉 튤립은 백합과 Tulipa속에 속하는 식물들만을 통칭하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진 특정 식물은 없고 산자고(山茨菰)라는 다년생 초본 즉 Tulipa edulis가 유일하게 Tulipa속으로 분류되는 우리 자생종이라고 Tulipa속을 튤립속이라고 하지 않고 산자고속이라고 하였는데 정작 산자고는 아마나(Amana)속으로 분리 독립하여 Amana edulis가 됨으로써 뻘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Tulipa속을 산자고속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산자고는 이미 1935년에 일본학자에 의하여 아마나(アマナ, 甘菜)속으로 분류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것이야 말로 시각을 다투어 속명을 얼른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하튼 이 튤립속의 모식종은 모든 튤립 원예종의 조상인 우리나라에 툴리파 게스네리아나로 등록된 Tulipa gesneriana인데 이를 중국에서는 울금향(郁金香)이라고 하며 이 속을 울금향속이라고 한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생하는 튤립이 없으므로 외래종으로만 구성된 이 속을 그냥 Tulip속이라고 하며 모식종인 Tulipa gesneriana을 tulip(チューリップ)이라고 하거나 울금향(鬱金香)이라고 한다.


튤립과 백합은 실물을 눈으로 보면 구별하기 어렵지 않아도 막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말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차이점이 다소 복합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우선 구근에서 백합은 구형이며 담백색이지만 튤립은 원추형이며 주로 황갈색이다. 꽃은 백합이 더 크고 나팔형이며 색상은 백색이 많지만 튤립은 상대적으로 꽃이 작고 주로 하늘로 향하여 피는 컵 형상이며 색상은 선황색이나 자홍색 양홍색 등 다양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꽃 모양으로만 구분 할 때는 나팔형은 백합이고 컵형은 튤립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서 백합이라고 하는 Lilium longiflorum이나 백합속의 모식종인 마돈나 릴리로 널리 알려진 Lilium candidum 그리고 우리 자생종 참나리나 솔나리 말나리 등이 모두 꽃잎 끝이 넓게 벌어지는 나팔형인 것이다. 따라서 컵 모양의 꽃이 피는 Liriodendron tulipifera를 백합나무라고 하면 안되고 튤립나무라고 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튤립속의 모식종이며 중국에서 울금향(郁金香)이라고 하는 툴리파 게스네리아나의 꽃 모양은 정말 튤립나무의 꽃을 많이 닮았다. 그래서 린네가 1753년 같이 시기에 명명한 이 수종의 학명을 Liriodendron tulipifera L.이라고 명명하였을 것 같다. 속명도 같은 튤립으로 하지 않고 백합으로 한 것은 아마 다른 모양의 꽃이 피는 수종이 발견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lily tree라는 취지로 명명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화석에서나 발견되는 이미 멸종된 종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현재까지 살아남아 백합나무속으로 분류되는 전세계에 존재하는 단 두 종은 모두 백합꽃과는 거리가 먼 튤립꽃을 닮은 꽃이 피고 있다. 백합나무속의 또 다른 종은 중국 진령(秦岭)이남과 베트남에서 자생하는 반상록 대교목인 중국백합나무 즉 Liriodendron chinense로서 나무의 키는 비슷하거나 상대적으로 약간 작고 꽃도 약간 작으며 꽃에 오렌지색상이 옅으며 잎모양도 달라서 구분이 되며 내한성도 약하다. 이 수종에 대하여는 다음에 다루기로 한다.




미국 동부가 원산지로서 내한성은 영하 34도로 매우 강하지만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온난한 지역에서는 잘 성장하지 못한다는 이 백합나무를 우리나라는 튤립나무라고 했다가 백합나무라고 하는 혼선을 빚고 있지만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원산지인 미국에서도 목재 시장에서는 엉뚱하게 포플러로 불려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원산지의 다양한 이름과 중국과 일본에서 불리는 이름들을 하나하나 파악하면 이 수종의 특성이 다소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에서는 tulip tree나 tulipwood라고 불리는 것 외에도 특히 목재 시장에서는 poplar라고 많이 불린다. 그 이유는 이 나무가 매우 큰 키와 바람에 떨리는 잎 모양이 미루나무를 비롯한 포플러들 즉 사시사무(Populus)속 수종들을 많이 닮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이 백합나무를 꽃 모양에서 온 tulip poplar라고 하거나 성목 심재의 색상이 녹황색이라고 yellow poplar라고 부른다. 하기야 꽃 색상도 노란색이 강하고 가을 단풍도 노란색이므로 yellow poplar가 어울리기는 한다.
그러나 실제 목재 시장에서는 tulip poplar나 yellow poplar라고 굳이 하지 않고 그냥 poplar라고 해도 이 백합나무로 통한다. 그런데 정작 사시나무속 포플러들 목재는 black poplar, Balsam poplar 등 수식어가 붙은 popla라고 하거나 아예 cottonwood나 aspen으로 달리 부른다. 그만큼 백합나무가 잘 자라면서도 목재로서 품질이 나쁘지 않아서 쓸모가 있기에 경제성이 높아 목재시장에서는 대량 거래되고 있으므로 진짜 포플러들을 밀어내고 백합나무가 그 이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끔 미네랄 성분이 착색되어 암자색이나 황녹색 등 다양한 어두운 색상을 띠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백합나무 목재는 rainbow poplar라고 부르며 귀한 대접을 받는다. 그 외에도 어린 나무의 심재는 노란색이 아닌 백색이기 때문에 whitewood라고도 불리며 초창기 이주자들은 이 나무로 통나무배 즉 canoe를 만들었기에 이를 canoewood라고도 불렀다. 그 외에도 잎 모양이 마치 바이올린이나 말 안장과 같이 생겼다고 fiddle tree나 saddle-leaf tree라고도 불렸다고 한다.







중국에는 언제부터 도입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백합나무를 자기들 진령(秦岭)이남 즉 중남부 광범위한 지역에 자생하는 아장추(鹅掌楸)에 대응하여 북미아장추(北美鹅掌楸)라고 한다. 아장추(鹅掌楸)는 희귀종이라서 중국에서도 20세기 들어와서 알려진 수종인데 그 잎의 모양 때문에 마괘목(马褂木) 또는 쌍표수(双飘树)라고도 불린다. 마괘(馬褂)는 청나라를 건국한 만주족들이 주로 말을 탈 때 입던 상의로서 흥선대원군이 청나라 유폐에서 돌아올 때 이를 입고 와서 국내서 변형된 것이 우리의 마고자이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북미아장추를 서양의 tulip tree에 상응하는 이름인 울금향수(郁金香树)라고도 한다. 일본에서는 백합나무가 정확하게 1875~6년에 도입되어 신주큐교엔에 심었으며 1881년 심은 나무가 아직도 그 자리에서 자라고 있다고 한다. 허 참! 동양 3국 중에서 글을 맨 늦게 배운 일본이 이런 기록은 정확하게 남기고 있다니! 일본에서는 이 백합나무를 유리노키(ユリノキ)라 하고 한자로는 백합목(百合木)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 별명으로 한텐보쿠(ハンテンボク)라고 하며 한자로는 반전목(袢纏木)이라고 쓰거나 연꽃을 연상시킨다고 연화목(蓮華木)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의 반전(袢纏)이란 중국의 마괘(马褂)를 많이 닮은 상의로서 주로 작업복으로 입었다. 그래서 마괘목(马褂木)과 반전목(袢纏木) 둘 중 하나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쪽에서도 밝히지는 않는다. 아무래도 일본이 중국을 따라서 한텐보쿠(袢纏木)라고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실제로 깃이 없는 상의를 닮은 것은 미국 백합나무가 아닌 중국백합나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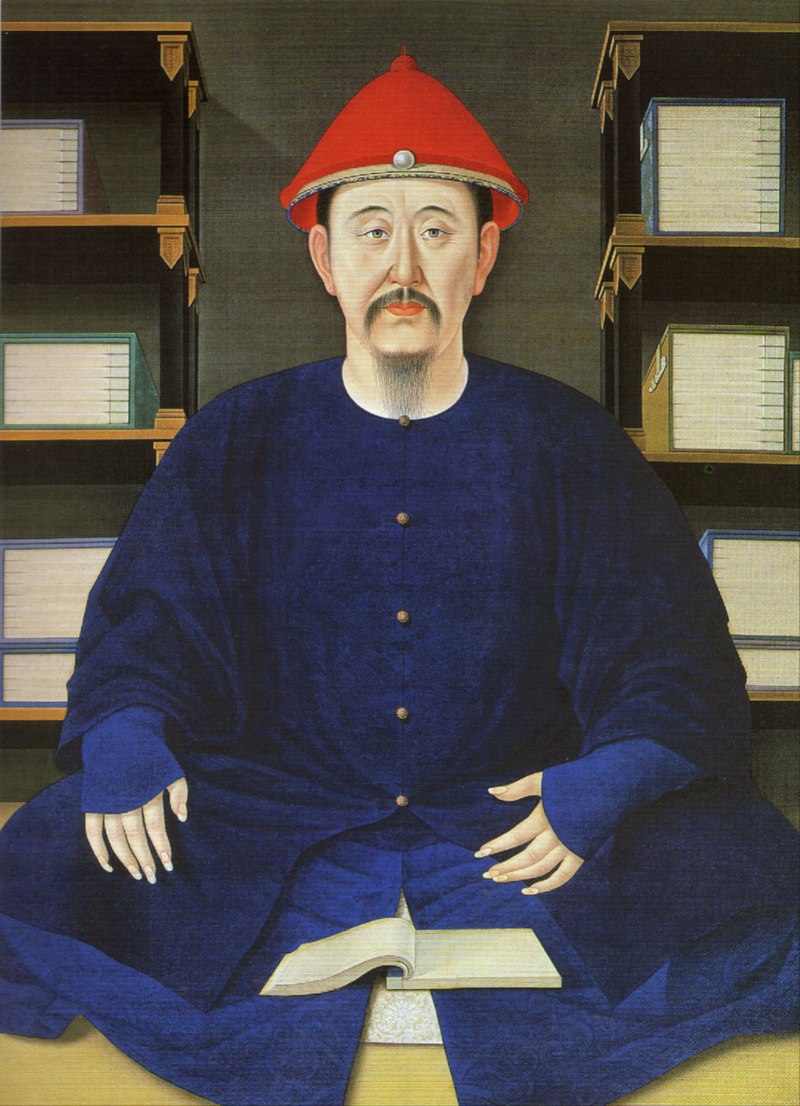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시절 임업시험장에서 1920년대 초반부터 이 백합나무 종자를 일부 도입하여 조경수로 심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60년대 말 정부의 대대적인 조림사업의 일환으로 1969년에 임업원구원에서 미국산 종자를 도입하여 시험조림에 들어간 다음 경기도 일원에 심어 그 결과가 좋았다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초창기에는 그 진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우리나라에 잘 자라며 경제성이 매우 높고 단점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 기후와 지질에 매우 적합한 수종으로 판단하고 권장수종으로 지정하여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식재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공공 공원에나 가야만 큰 나무를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수명이 200~300년이 된다는 이 수종이 최소한 15~20년이 지나야 첫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심고 나서 한 10년을 기다려도 가지도 거의 없이 위로만 자라며 꽃이 피지 않기에 실망하였던 것 같다. 그 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백합나무가 낙엽송이나 잣나무보다 성장속도가 2배 빠르면서도 경제성은 10배나 높은 미래의 우수 산림자원으로 확인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큰 공원의 조경수로 목재 생산용 조림수로 풍부한 과즙을 생산하는 밀원수로 많이 심어 왔다. 그리고 가로수로도 매우 적합한 나무라고 세계 4대 가로수로 선정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매우 높아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하므로 보기에도 좋은 이 백합나무를 전국 가로수로 심으면 좋으련만 우리나라는 그만 도로변 전신주 때문에 키가 너무 큰 이 수종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니 아쉽다.





여기서 이 수종의 우리나라 국명이 혼란스럽게 된 원인을 밝힐 실마리가 나오는 것 같다. 1925년 경에 조선총독부 시절 임업시험장에서 최초로 종자를 도입하여 국내에 심었다면 그 때는 당연히 국명이 없으므로 일본 이름 유리노키(ユリノキ)의 한자명 백합목(百合木)을 그대로 따라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1969년에 와서 재도입할 당시에 임업원구원에서는 그 전신인 임업시험장 시절 쓰던 용어 그대로 백합목(百合木) 또는 백합나무라고 하였을 것이 자명하다. 그렇지만 그 후 1980년 식물학자 이창복박사가 튜울립나무라고 이름을 제대로 붙여 줘서 국표식에는 그렇게 등록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2001년부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권장수종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이 수종의 식물학계 이름과 관공서의 이름이 달라서 불편하였던지 2013년 2월에 국표식의 국명을 백합나무라고 변경하고 만다. 실제로 튤립나무가 백합나무로 변경되기도 전인 2006년 7월 17일 서울신문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팀 담당자와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정명인 튤립나무는 단 한 번의 언급도 없이 시종일관 백합나무라고 언급하고 있다. 정말 이렇게 되어 일본을 따라서 엉터리 이름으로 변경되었다면 관공서 편의를 위하여 일본식 이름을 뒤늦게 2013년에 와서 도입한 꼴이 되므로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도 백합목(百合木)이라고는 하지만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서양 튤립이 19세기 말에 도입되었지만 1970년대까지는 일본의 저명한 식물학자인 마키노의 유명한 목야식물도감(牧野植物図鑑)에 근거하여 Tulipa gesneriana를 보탄유리(ぼたんゆり) 즉 모란백합(牡丹百合)으로 불렀던 것이므로 유리(ゆり)의 개념에 처음부터 튤립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목련목 목련과는 100% 목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백합나무속외에도 목련속과 미켈이아(함소화)속 그리고 망글리에티아속 등 4개 속으로 구분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백합나무속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목련속으로 통합시키고 있다. 따라서 백합나무속은 유일하게 거대한 목련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남은 속인데 그 열매의 모양과 색상이 다르고 딱정벌레 등 곤충이 매개하는 목련과는 달리 딱정벌레 외에도 벌과 파리도 매개하므로 꽃가루 매개자가 다르다. 목련의 열매는 대개 원주형 취합과로서 성숙하면 배봉선이 열려 터져 나오는데 이런 열매를 골돌과(蓇葖果)라고 한다. 골돌과(蓇葖果)는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다양하게 분류하려다 보니 중국에서 목련이나 작약 팔각 등과 같은 독특한 구조와 형태를 가진 부류의 열매에다가 붙인 이름이다. 그 외에도 열매를 분류하는 이름들 중에는 수과(瘦果)나 삭과(蒴果) 영과(穎果) 포과(胞果) 등 매우 어려운 중국식 이름이 많은데 우리 식물학계는 이들을 쉽고 적당한 우리식 이름으로 풀이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백합나무의 취합과는 방추형 목질이며 성숙한 열매는 날개가 있는 시과(翅果)로서 열리지 않고 그대로 날려 떨어지면서 산포된다. 그리고 잎 모양도 대개 장타원형인 여타 목련과는 완연하게 다르게 끝이 편평하거나 오히려 약간 오목하게 잘려나간 특이한 모습을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합나무과 목련과에 속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목련과 마찬가지로 수술과 암술이 원뿔모양의 긴 화탁에서 나선형으로 돌려나고 있으며 자가수분을 피하기 위하여 자성선숙(雌性先熟)하며 꽃잎과 꽃받침의 구분이 없이 모두 화피편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같다는 것이다.






등록명 : 백합나무
과거명 : 튤립나무
학 명 : Liriodendron tulipifera L.
분 류 : 목련과 백합나무속 낙엽 대교목
원산지 : 미국 동부
영어명 : tulip tree, tulip poplar, yellow poplar, canoewood, fiddle tree, saddle-leaf tree
중국명 : 북미아장추(北美鹅掌楸), 울금향수(郁金香树)
일본명 : 백합목(百合木), 반전목(袢纏木), 연화목(蓮華木)
수 고 : 30~60m
지 름 : 1~2m
수 피 : 세로로 깊게 갈라짐
줄 기 : 소지 갈색 혹 자갈색, 백분
잎특징 : 길이 7~12cm, 4렬, 유엽배면 백색세모 후 탈락
잎자루 : 5~10cm
꽃특징 : 배상, 화피편 9
꽃받침 : 외륜 3편 녹색 꽃받침형, 외향 하수
꽃 잎 : 내양륜 6편, 회록색, 직립, 꽃잎형, 난형 4~6cm, 기부 황색
수 술 : 20~50개, 화약 1.5~2.5cm, 화사 1~1.5cm
암술군 : 60~10개, 황록색, 개화기 화피편 불초과
꽃특징 : 자성선숙 12~24 일조시간만 자성기
취합과 : 7cm, 다수의 시과 복와상 배열 담갈색, 하부소견과 숙존
개화기 : 5월
결실과 : 9~10월
용 도 : 밀원식물, 목질 우량, 담황갈색, 무늬 치밀미관, 가공 용이, 가구재 등
특 징 : 15~20년생부터 개화하는 만숙성(晩熟性)
최적지 : 습하고 비옥한 저지대 골짜기나 산비탈
수 명 : 약 300년
내한성 : 영하 34도
















'목련과 > 백합나무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326 백합나무 '인테그리폴리움' - 잎의 결각과 거치가 없는 매끈한 품종 (0) | 2021.02.02 |
|---|---|
| 1325 백합나무 '파스티기아툼'('파스티기아타') - 직립백합나무 (0) | 2021.02.02 |
| 1324 백합나무 '크리스품' - 잎이 뒤틀리고 매끈한 품종 (0) | 2021.02.01 |
| 1323 백합나무 '아우레오마르기나툼' - 노란 테두리 무늬종 (0) | 2021.02.01 |
| 1322 백합나무 '아디스' - 정원수로 적합한 왜성종 (0) | 2021.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