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목련은 키가 일정하지는 않아 원산지에서는 최대 10m까지도 자란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최대 5m 정도만 자라는 관목 또는 소교목으로서 우리나라에 등록된 목련들 중에서는 자목련 다음으로 키가 작다. 일본 열도 중간쯤에 위치한 나고야시(名古屋市) 남쪽 태평양을 둘러싼 이세만(伊勢湾) 주변 지역인 아이치현(愛知県) 기후현(岐阜県) 미에현(三重県) 등에서만 극히 일부 자생하는 멸종위기 일본 고유종이다. 비록 우리나라 국가표준식물목록에는 2011년에 등록되어 있지만 훨씬 전에 국내에 도입되어 나름대로 널리 알려져 두산백과 등 일부 도감에도 등록된 수종이다. 아마 왜성종이라서 분재로 인기가 높은 것도 하나의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미 1971년에 부산 금강식물원에서 채집한 표본이 경상대에 남아 있는데 그 당시 이름이 작은잎목련으로 되어 있어 흥미롭다. 별목련의 원산지 일본 이름은 시데고부시(シデコブシ)이고 한자로는 폐신이(幣辛夷) 또는 사수권(四手拳)이라고 쓰며 별명으로 히메고부시(ヒメコブシ, 姫拳)라고도 불린다. 바로 이 히메고부시가 작은 목련이라는 뜻이므로 작은잎목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한다. 부산 금정구에 있는 금강수목원은 원래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정원을 조성하였던 터라서 아마 일본에서 가져다 심은 별목련이 자라고 있었던 것 같다.





별목련의 일본 정명 시데고부시는 시데와 고부시가 결합한 용어인데 시데(シデ)는 한자로 幣(폐) 또는 四手(사수)로 쓰지만 둘이 비슷한 뜻으로 일본에서는 신사에서 신전에 바치는 금줄이나 늘어뜨리는 종이를 말한다. 과거에는 비단 즉 백(帛)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종이로 대신한다는 것인데 비단으로 만들었기에 폐백(幣帛)이라고 하였지만 나중에는 음식물을 제외한 봉헌하는 모든 것을 통칭한다. 우리가 결혼식에 하는 폐백(幣帛)과 같은 맥락의 용어이다. 원래 폐백(幣帛)은 중국에서 유래된 한자어로 중국에서는 고대 신이나 임금에게 바치는 물건을 뜻하는데 이게 일본에 와서는 신사에 올리는 모든 제물이라는 뜻으로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백(幣帛)이 신이나 임금에게 바치는 예물이라는 원 뜻보다는 혼인할 때 신랑신부가 서로 양가 부모에게 보내는 예물이나 신부가 큰 절을 하면서 바치는 과일 등을 뜻하는 용어로 주로 쓰인다. 여하튼 일본에서는 별목련의 길고 휘어진 꽃잎이 종이를 늘어뜨린 것과 비슷하다고 본 것이다. 고부시(コブシ)는 한자로는 辛夷(신이)나 拳(권)으로 쓰며 둘 다 일본에서 목련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일본 별명 히메고부시(ヒメコブシ, 姫拳)는 작고 귀여운 고부시라는 뜻으로 여기서 고부시(コブシ)는 다분히 우리나라에도 자생하는 나무 높이도 잎 사이즈도 별목련에 비하여 훨씬 큰 목련 즉 Magnolia kobus를 지칭한다.


그러고 보니 일본 이름에는 별이라는 뜻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 왜성 목련을 별목련이라고 할까? 그 이유는 학명 Magnolia stellata의 종소명이 별빛이 비치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어명도 star magnolia라고 하며 중국명도 성화옥란(星花玉兰)이라고 별꽃목련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과연 이게 별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저 별이라면 다섯 개의 꼭지점이 있는 오성(五星)을 주로 연상하지 이렇게 꽃잎이 9~18장 최대 30장이 넘는 꽃 모양을 별과 같은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알고 보니 별이 장군 별과 같은 오성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지 외국인들 특히 서양인들은 매우 다양하게 사방으로 빛이 퍼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꽃잎이 매우 많은 이 수종을 star magnolia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달리 꽃잎이 많고 사방으로 넓게 활짝 펴져서 피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별목련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부르는 것이다. 물론 서양에서도 꽃잎이 5장으로 정말 오성과 같이 생긴 오공국화를 goldenstar라고 부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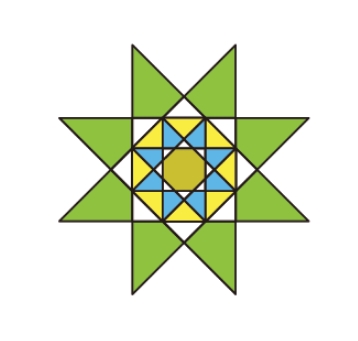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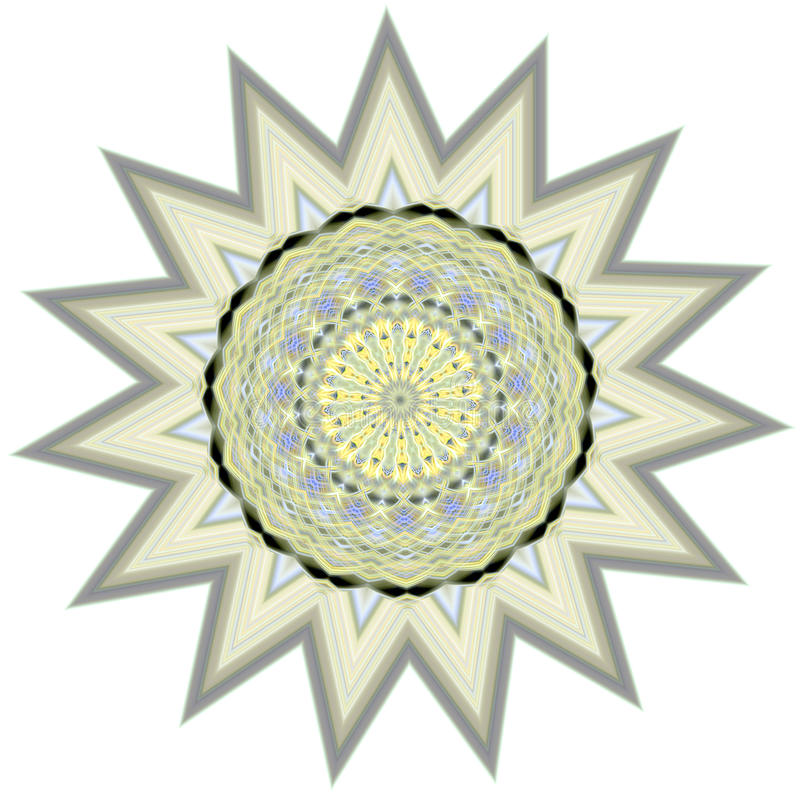



별목련의 학명 Magnolia stellata Maxim.는 원래 일본 체류 독일 식물학자인 지볼트에 의하여 1845년에 Buergeria stellata Siebold & Zucc.라고 명명되었으나 이 속명이 동물 개구리와 중복되어 러시아 식물학자 맥스모비치가 현재의 속명으로 변경하여 1875년에 Magnolia stellata (Siebold & Zucc.) Maxim.라고 재명명한 것이다. 그 사이 우리 자생종 목련 즉 Magnolia kobus의 변종이나 품종으로 명명한 학자도 있었으며 꽃 색상이 붉은 종을 별도의 독립된 종으로 Magnolia keiskei나 Magnolia rosea 등으로 명명한 학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모두 Magnolia stellata 하나로 통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만 최근인 2008년에 중국 식물학자인 하념화(夏念和,1963~ )가 옥란속으로 편입하면서 명명한 Yulania stellata (Maxim.) N.H.Xia를 중국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신학명의 기초 표본 명시가 문제가 되어 2012년 또 다른 중국 식물학자 사마영강(司马永康, 1967~ )박사 즉 Y. K. Sima와 육수강(陆树刚, 1957~ ) 운남대교수 즉 S. G. Lu에 의하여 수정 명명된 학명 Yulania stellata (Siebold & Zucc.) Sima & S.G.Lu가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후자가 적법한 학명으로 판단된다. 가끔 오래된 일본과 중국 도감에 별목련을 1794년 툰베리가 명명한 학명 Magnolia tomentosa Thunb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삼지닥나무를 잘못 명명한 것이므로 현재는 비합법명으로 처리 된다.


이 정도로 별목련의 탐구가 끝난다면 그래도 아주 복잡하지는 않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리나라 두산백과를 비롯한 많은 도감에서 이를 중국원산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중국에는 이런 목련이 자생하지 않고 일본에서만 그것도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자생한다고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일본 고유종이 틀림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그런데 찾아보니 우리나라 도감뿐만 아니라 일본의 상당수 옛날 도감에서도 중국 원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자세한 내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추정해 본다면 여기저기 일본 전역 민가에서 많이 재배는 하지만 별목련의 뚜렷한 자생지를 일본 산야에서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에 개나리가 매우 흔하지만 제대로 된 자생지가 없다는 점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다. 그래서 막연하게 중국에서 도입된 종이라고 여겼다가 일본 긴키지방(近畿地方) 동해층군(東海層群) 뇌호도토층(瀬戸陶土層)의 화석에서 약 1,000만년 전의 별목련 종자가 발견됨으로써 일본 원산임이 확실하게 입증된 것 같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별목련을 살아 있는 화석 즉 유존종(遺存種)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석 발견이 없었다면 일본 고유종이라는 주장을 할 만한 변변한 자생지가 없다는 이야기도 된다. 여하튼 일본에서는 점차 사라지고 몇 안 되게 남은 자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서 보호에 힘쓰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에서 자기들이 이 목련의 원산지이며 자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1987년 중국에서 이 Magnolia stellata와 비슷한 목련이 절강성(浙江省) 여수시(丽水市) 경녕현(景宁县) 초어당(草鱼塘)에서 자생하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표본을 채집을 하여 중국명을 경녕목란(景宁木兰)이라고 하고 중국 식물학자 구보림(裘宝林, Chiu Pao Ling)과 진정해(陈征海, Chen Zheng Hai)가 공동으로 1989년 Magnolia sinostellata P.L. Chiu & Z.H. Chen라는 신종으로 학명을 발표한다. 그런데 국제적으로는 이를 대부분 일본 별목련의 유사종으로 봐서 통합시키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일본의 별목련과 동일한 종인지 아니면 별도의 새로운 종인지 또는 일본 별목련이 중국에 귀화되어 자란 종인지에 대한 판단이 보류된 존의종(存疑种) 상태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별목련 즉 Magnolia stellata는 성화목란(星花木兰)이라고 하며 일본 원산으로 인정을 하지만 자국내서 경녕목란(景宁木兰)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종이 절강성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신종에다가 중국(sino) 별목련(stellata)이라는 뜻의 학명 Magnolia sinostellata를 붙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옥란속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는 일단 Magnolia sinostellata와 별목련인 Magnolia stellata를 모두 Yulania stellata 즉 성화옥란(星花玉兰)에 통합시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 별목련은 현재로서는 중국 원산이 아닌 일본 고유종인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별목련이 목련 즉 Magnolia kobus와 관련성이 많고 다소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비교할 정도로 유사한 것은 아니다. 우선 나무 자체의 높이가 주로 3m에 불과하여 20m까지 자라는 대교목인 목련과 비교 대상이 아니고 잎 사이즈도 길이가 거의 두 배이고 면적으로는 거의 4배나 차이가 난다. 그리고 꽃잎도 목련은 꽃받침 포함 9장인데 반하여 별목련은 최대 30장이 넘어 비교되지 않는다. 다만 꽃의 사이즈는 서로 비슷하여 나무 사이즈에 비하여 별목련의 꽃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별목련은 겹꽃에 색상이 아름답고 왜성이라서 가정의 작은 정원은 물론 화분에 심어서 재배할 수도 있으므로 그 자체로도 인기가 높아 다양한 원예종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2종이나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다. 게 중에는 영국 왕립원예학회로부터 우수 정원수라고 인정받은 ‘센테니알’ ‘제인 플렛’ ‘로열 스타’ 같은 품종들도 있다. 그리고 별목련 자체의 원예품종 외에도 목련이나 자목련 또는 버들목련과의 교잡에 의한 매우 많은 원예품종들이 개발되어 있다. 그 중 목련과의 교잡종은 우리나라에 큰별목련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19종이나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자목련과의 교잡으로 탄생된 그 유명한 8공주들이라는 앤 주디 수잔 베티 제인 랜디 리키 핑키 등 8개 품종들 모두 등록되어 있다. 버들목련과의 교잡종인 프록터목련 또한 빠지지 않고 국내 등록되어 있어 별목련은 이래저래 목련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수종임에 틀림이 없다.


등록명 : 별목련
학 명 : Magnolia stellata (Siebold & Zucc.) Maxim.
신학명 : Yulania stellata (Siebold & Zucc.) Sima & S.G.Lu
분 류 : 목련과 목련속 낙엽 관목 또는 소교목
신분류 : 목련과 옥란속 낙엽 관목 또는 소교목
원산지 : 일본 고유종
일본명 : 시데고부시(幣辛夷, 四手拳), 히메고부시(姫拳)
중국명 : 성화옥란(星花玉兰)
영어명 : star magnolia
수 고 : 2.5~4.5m 최대 10m
수 피 : 회갈색, 아로마 향기
줄 기 : 무성, 당년지 녹색, 백색 견모, 2년생 갈색
동 아 : 평복장유모 밀생
잎모양 : 도란상장원형, 정단둔원, 급첨 담점첨, 기부 점협착설형
잎색상 : 상면 심록색, 무모, 하면 천록색, 중맥 엽병 유모
잎자루 : 3~10mm, 탁엽흔 1/2
꽃망울 : 난원형, 담황생장모 밀생
잎크기 : 4~10 x 1.5 ~4cm
꽃특징 : 선엽개방, 직립, 방향, 지름 6~11cm 백색에서 자홍색까지 다양
화피편 : 외륜악판상 피침형 1~3개 1.5~2cm x 2~3mm, 조기 탈락
내 륜 : 다수륜, 12~45편, 협장원상 도란형, 4~5 x 0.8~1.2cm
취합과 : 5cm, 부분적 미발육 비틀림
개화기 : 3~4월
특 징 : 최초 적령기 낮고 개화 후 서리는 물론 강풍과 비에도 꽃잎이 손상됨
내한성 : 영하 28도
용 도 : 관상용, 약용















'목련과 옥란속 > 별목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120 별목련 '킹 로즈' (0) | 2020.10.21 |
|---|---|
| 1119 별목련 '제인 플랫' (0) | 2020.10.21 |
| 1118 별목련 '돈' (0) | 2020.10.21 |
| 1117 별목련 '크리산테미플로라' = 별목련 '천리포' (0) | 2020.10.21 |
| 1116 별목련 '센테니알' (0) | 2020.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