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명 Rhododendron simsii Planch.에다가 국명을 심스아잘레아라고 등록된 수종이 있는데 이게 바로 중국에서 기원전 1000여 년경 무왕벌주(武王伐纣) 전쟁에 참전하여 용맹을 떨친 촉의 망제(望帝) 두우(杜宇)가 은거 후 고국을 그리워하다가 죽어 두견새가 된 다음 매년 봄이면 슬피 울다가 피를 토하고 죽으면서 주변을 붉게 물들인 꽃나무라는 두견(杜鵑)이다. 봄에 두견새가 나타나서 울 때 두견화가 피기 때문에 이런 전설이 생긴 것이다. 매년 꽃피는 봄이 오면 두견새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중국 뿐만 아니라 우리 옛 선조들도 고향을 그리워하며 수많은 선비들이 노래한 망향의 애환이 서린 수종이 두견화이다. 그런데도 이 수종에다가 엉뚱하게 심스아잘레아라는 운치 없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 매우 못마땅하다. 나름대로 이렇게 등록한 이유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이 수종을 서양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 Sims’s Azalea를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중국에서 두견화를 노래한 유명한 시로는 당나라 시선(詩仙)으로 부리는 이태백(李太白, 701~762)이 755년에 쓴 선성견두견화(宣城见杜鹃花)라는 짧은 시가 있다.
蜀国曾闻子规鸟(촉국증문자규조)
옛날 촉땅에서 두견새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宣城还见杜鹃花(선성환견두견화)
여기 선성에서 다시 두견화를 보는구나.
一叫一回肠一断(일규일회장일단)
두견새 울 때마다 애간장 끊어지네
三春三月忆三巴(삼춘삼월억삼파)
춘삼월 봄날에 파촉이 그립구나.
실제로 이태백은 어릴 적 파촉 검문각 부근에서 산 적이 있다는 설이 있으며 시인이 시를 쓸 당시 있던 선성(宣城)은 현재 안휘성이므로 사천성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 천만리 타향에서 두견화를 보자 고향에서 슬프게 울던 두견새 생각이 문득 나면서 그 울음소리로 대변되는 고향의 소리가 마음 속에서 들려 그 애절한 향수(鄕愁) 즉 회향지념(怀乡之念)을 노래한 것이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는 “여기 선성에서 다시 심스아잘레아를 본다.” 라고 번역해야 하겠는가? 우리 선조들도 귀촉도나 불여귀 또는 자규라고 부르기도 하는 두견새와 두견화를 많이 노래했다. 춘향가에도 나오고 새타령에도 나오고 김삿갓의 시에도 나온다. 김삿갓이 어느날 산에 오르다가 두견화가 핀 것으로 보고서 옆에 있던 노인에게 한 가지 꺾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금새 마음이 바뀌어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고 떠났다는 것이다.
두견일지증야객(杜鵑一支贈野客) - 두견화 한 가지 꺾어서 길손에서 준다면
명년두견하처곡(明年杜鵑何處哭) - 명년 두견새는 어느 가지에 앉아서 울겠는가.
그리고 1939년에 발표된 당대 대가수 백년설(1914~1980)선생의 두견화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이후 고 조미미선생과 이호섭선생 등 많은 가수들이 다시 불렀다.

두견화사랑의 2절과 3절의 가사는 다음과 같은데 아무래도 고향에 두고온 님을 그리워 하는 것 같다.
눈물로 엮은 사랑 여울에나 던져서 괴로움을 잊을게냐
흐르는 기적소리 처량하다. 눈물 젖은 베개가
서러워 서러워 서러워 웁니다.
옥비녀 죽절비녀 님께 바친 첫선물 버리지나 않았을까
낮설은 지붕 밑에 임을 불러 목메인 이 밤이
가엾어 가엾어 가엾어 웁니다
물론 위 김삿갓의 시나 백년설의 노래에 나오는 두견화가 중국의 두견화일 수는 없고 우리나라 자생종 진달래나 산철쭉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가표준식물목록에 식물 이름을 정하여 등록하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표준어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접하지 못 하였던 식물은 현대 감각에 맞게 부르더라도 과거에 선조들이 많이 접하고 이름을 정하여 불렀던 식물은 최대한 그 이름을 존중하여 그대로 따르면 될 것을 왜 어렵게 국명을 붙이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고 본다. 중국에서 말하는 두견이 처음부터 반드시 학명 Rhododendron simsii인 특정 수종만을 지칭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냥 두견(杜鵑)이나 척촉(躑躅) 둘 다 특정한 하나의 수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그 비슷한 무리들 모두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그래서 명대 문신 주국정(朱国祯, 1558~1632)이 쓴 용당소품(涌幢小品)이라는 수필집에 두견의 경우 2~3월에 두견새가 울 때 피지만 선엽후화(先叶后花)하고 색이 진한 붉은(丹如血) 종과 선화후엽(先花后叶)하며 색상이 옅은(淡) 두 종류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봐서 명나라 때까지만 하여도 두견은 진달래속 중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영산홍아속 중 적색 계통의 꽃이 피는 종류를 통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다가 명대의 왕상진(王象晋, 1561~1653)이 저술한 식물지 군방보(群芳谱)를 청나라 강희제 시절 문신인 왕호(汪灏)가 1708년 수정 보완한 광군방보(广群芳谱)에서 아마 이 수종을 두견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국식물지도 이 광군방보를 근거로 삼는다. 아마 파촉지역에 이 수종이 많이 자생하는데다가 꽃 색상이 혈색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고로 척촉이라고 추정하는 학명 Rhododendron molle인 특정 수종인 양척촉(羊躑躅)도 두견과 비슷하게 중국 중남부 광범위한 지역에서 자생하지만 노란색 꽃이 피어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 따라서 두견은 산척촉(山躑躅)이라고 하고 반면에 양척촉은 황두견(黃杜鵑)이라고 한다. 그리고 원래는 두견이나 척촉과 같은 의미로 진달래속에 두루 쓰였던 영산홍(映山紅)은 붉은 꽃이 피는 수종에만 붙일 수가 있고 노란 꽃이 피는 양척촉에는 붙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와 같이 두견이 좁은 의미로 특정 수종을 지칭하는 것과는 달리 현재 중국에서는 넓은 의미로 만병초 등을 포함한 진달래속 전체를 통칭하는 용어로도 사용한다. 따라서 중국에 자생하는 Rhododendron속 즉 진달래속 500여 개 수종들을 거의 대부분 xx두견이라는 이름으로 통일되게 부르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두견화 사랑도 남다르다. 일찍이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 772~846)는 815년에 쓴 산석류기원구(山石榴寄元九)라는 제법 긴 시 가운데 두견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의 찬사를 표현한 바 있다. “花中此物是西施(화중차물시서시), 芙蓉芍药皆嫫母(부용작약개모모)” 풀어서 해석하면 꽃 가운데 두견이야말로 서시(西施)에 비유할 수 있고 연꽃과 작약은 이에 비하면 모모(嫫母)에 불과할 뿐이라는 이야기이다. 서시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미인이고 모모는 가장 추한 여인으로 비유되는 인물이다. 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연꽃과 작약을 이렇게 과감하게 깎아 내리는 비유는 백낙천이 아니면 감히 누가 할 수 있겠는가? 1987년 상해에서 실시한 약 15만 명이 참가한 국민투표에서 두견화는 당당 6번째로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꽃으로 선정된다. 참고로 백낙천이 모모(嫫母)에다가 비유한 부용과 작약을 포함한 모란 둘 다 10대 명화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 조선초 문신이자 원예가인 강희안이 일본에서 진상한 왜철쭉을 백낙천이 서시(西施)에 비유한 그 문구 그대로 인용하여 칭송하는 내용이 있다. 이번에는 모모(嫫母)로 전락하는 희생양이 만첩산철쭉으로 추정되는 우리 자생종으로서 자이엽천자(紫而葉千者) 즉 자색 겹꽃이 피는 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뭘 이렇게 까지 우리 것을 깎아 내리냐 하고 생각하였으나 백낙천의 모모(嫫母)가 연꽃과 작약이라면 결코 화낼 일도 아니다. 그런데 그 때 강희안이 하나는 화분에 심고 하나는 땅에 심었더니 월동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꽃 색상이 석류색이라고 언급한 것 그리고 재배하기 까다로와 실전된 것 등으로 봐서는 혹시 일본에서 대만산철쭉(台湾山躑躅) 또는 당고월(唐皐月)이라고 불리는 이 수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 두견은 내한성이 영하 9도로 한양에서는 노지월동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이 두견화(杜鵑花)를 산석류(山石榴)라고도 하기 때문이다.
두견 즉 심스아잘레아는 중국 강소성 안휘성 사천성 운남성 등 중남부 거의 전지역에서 자생하며 대만과 태국 라오스 등 동남아와 일본 류큐열도에서도 발견된다고 한다. 일찍이 일본 히라도섬으로 흘러가 거기서 일본 자생종들과 교잡이 이루어져 히라도철쭉이 탄생하였으며 그 중에서 자색 큰 꽃이 피는 대표적인 품종인 오-무라사키(大紫) 품종이 우리나라에 건너와 도로변이나 공원 등에 심어지면서 영산홍이라고 불린다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물론 오-무라사키 품종은 중국 두견과 직접적인 혈연관계는 없다. 그런데 이 중국 두견이 일본 자생종 영산홍 즉 학명 Rhododendron indicum인 사츠키(皐月)와 꽃모양이 매우 흡사하여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서양에서 많이 헷갈려 하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슷한 꽃 모양의 수종이 많기도 하지만 개화기가 사츠키보다는 많이 빠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꽃 모양은 다소 비슷하지만 꽃 수술이 두견은 10개로 5개인 일본 사츠키와 구분이 되고 잎도 사츠키에 비하면 넓고 크다. 두견의 잎은 혁질이고 미세한 거치가 있지만 사츠키의 잎은 작고 좁으며 반혁질에 광택이 있고 거치는 거의 없거나 미세한 둥근 거치가 있다.




이 중국 두견은 최소한 1812년 이전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식물 채집가 James Vere의 정원에서 재배되는 것을 본 John Sims(1749~1831)라는 사람이 처음 이를 소개하였다. 그는 매우 오랫동안 발간된 유명한 Curtis's Botanical Magazine이라는 식물잡지의 초대 편집장으로 일하던 영국 내과의사 겸 식물학자이다. 그 때 그는 이 수종을 일본 사츠키 와 동일한 줄로 알고서 학명을 Azalea indica라고 표기했다. 그러다가 프랑스 식물학자 Jules Émile Planchon(1823~1888)에 의하여 1854년 진달래속의 독립된 종으로 현재의 학명인 Rhododendron simsii Planch.로 명명된다. 여기서 종소명은 당연히 심스(Sims)가 소개하였던 그 종이라는 뜻이다. 그 후 매우 다양한 학명이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발표되었는데 그 중에는 둘이 비슷하여 한때는 사츠키의 변종이라고 Rhododendron indicum var. simsii라고 명명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는 둘이 별개의 종임을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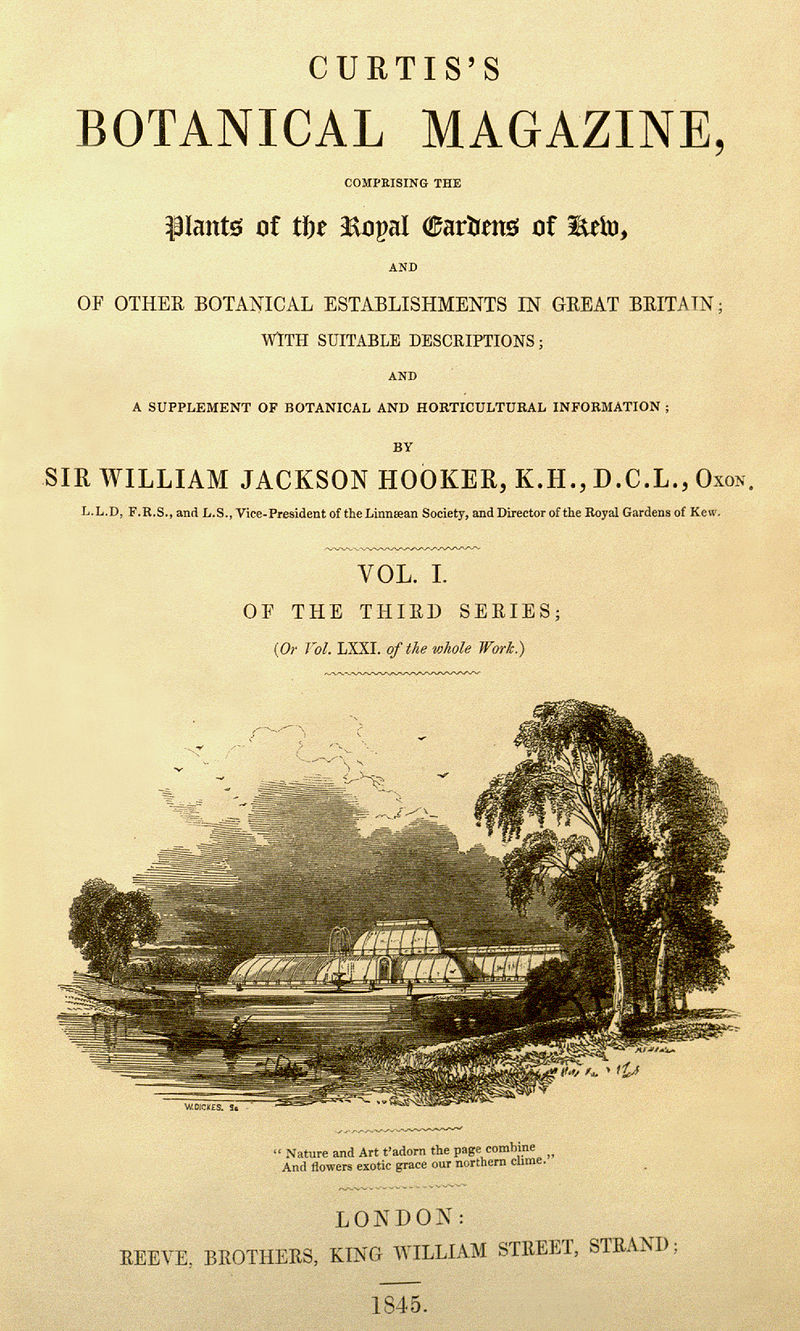
일본의 사츠키가 내한성도 강하고 생명력도 강하여 뒤늦게 1833년에 유럽에 상륙하자마자 생명력이 약한 중국 두견을 화단에서 밀어내 버려 현재 유럽에는 중국 두견의 원종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전에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중국 두견을 실내 화분용으로 품종 개량을 시작하여 진화를 거듭하여 그 품종의 수가 2천 종에 달한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유럽에서는 Rhododendron simsii라고 하면 바로 이 원예품종군을 이르는 말로 통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에서 위 학명을 검색하면 원종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 다양한 원예종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 그래서 추측컨대 그 원예품종 하나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2018년에 심스아잘레아라는 국명으로 등록된 것이 아닌가 한다. 원종이 중국의 두견(杜鵑)인 줄을 몰랐을 리는 없고 알았더라도 원예종이므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학명을 원종인양 Rhododendron simsii Planch.라고 쓰면 안되고 교잡 원예종임을 밝힌 Rhododendron simsii hybrids 등으로 표기해야 마땅해 보인다. 아래 특성은 원종에 대한 것이다.
등록명 : 심스아잘레아
희망명 : 중국 두견화
학 명 : Rhododendron simsii Planch.
분 류 : 진달래과 진달래속 상록 관목
그 룹 : 아잘레아, 영산홍아속
원산지 : 중국, 대만, 동남아, 류큐열도
중국명 : 두견(杜鵑) 산척촉 산석류 영산홍
일본명 : 대만산철쭉(台湾山躑躅), 당고월(唐皐月)
영어명 : Sims’s Azalea
수 고 : 2~5m
잎특징 : 혁질, 1.5~5 x 0.5~3cm, 잎자루 2~6mm
꽃차례 : 지정 2~6송이 족생
꽃특징 : 장미색, 선홍색 암홍색, 상부 열편 심홍색 반점
꽃부리 : 3.5~4 1.5~2cm
수 술 : 10개, 화관과 등장
암술대 : 화관 밖으로 돌출
개화기 : 4~5월
내한성 : 영하 9도
용 도 : 관상수, 약용(근,엽,화)












==============================
다음은 유럽에서 개량된 원예품종들 즉 Rhododendron simsii hybrids 중 극히 일부이다.







'진달래과 진달래속 > 영산홍아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359 대만철쭉 - 대만의 금모두견(金毛杜鹃) (0) | 2021.03.07 |
|---|---|
| 1358 대만고산철쭉 – 포복성 관목 (0) | 2021.03.07 |
| 1356 영산홍의 정체는 일본 히라도철쭉 오-무라사키(大紫) 품종 (0) | 2021.03.04 |
| 1354 영산홍 원예품종 - '마크란툼' '카호' '발사미니플로룸' (0) | 2021.03.02 |
| 1353 영산홍(映山紅)–일본 오월철쭉(皐月躑躅)으로 주변의 영산홍과는 다른 수종 (0) | 2021.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