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미과는 장미아과와 아몬드아과로 대체로 크게 둘로 나눠지고 아몬드아과는 목본의 경우 벚나무속 하나로 구성된 아몬드족과 가침박달족 사과나무족 황매화족 국수나무족 조팝나무족과 쉬땅나무족 등 7개 족(族, tribe)으로 분류된다. 앞에서 아몬드족 즉 벚나무속의 탐구를 마쳤으므로 이제부터는 가침박달족의 탐구를 시작한다. 가침박달족은 가침박달속과 오임레리아속 그리고 빈추나무속 등 모두 3개 속에 겨우 10종이 등록되어 있는 매우 간단한 속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미과 목본 37속 중 하나인 가침박달속은 중국과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극히 일부가 중앙아시아 투르키스탄에 분포하는 키가 5m이내인 낙엽 관목으로서 한때는 수많은 종으로 분류되었지만 최근의 체계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여 이들 모두를 하나의 속으로 통합하여 분류하고 있다. 그 통합된 하나의 속이 바로 우리나라에 진주가침박달로 등록된 Exochorda racemosa (Lindl.) Rehder이다. 하지만 주 원산지인 중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아직도 4~5개의 속으로 분류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 국표식에는 4종 2변종 1잡종이 등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학명 Exochorda serratifolia S.Moore인 가침박달만이 우리나라 거의 전역에 분포하는 우리 자생종이다.
가침박달속의 특징
1858년 영국 식물학자인 John Lindley(1799~1865)에 의하여 창설된 가침박달속의 특징은 동아가 난형이고 털이 없으며 수 매의 인편이 복와상(覆瓦狀)배열한다. 복와상이란 마치 기왓장처럼 한쪽은 아래로 한쪽은 위로 포개진 모습을 말한다. 잎자루가 있는 잎은 단엽으로 호생하며 거치가 없는 경우가 많고 탁엽은 없거나 있더라도 조기 탈락한다. 4~5월에 피는 양성화는 악통이 종모양이고 악편은 5개이며 짧고 넓다. 백색인 꽃잎은 5장으로 넓은 도란형이며 기부에 갈퀴가 있으며 복와상배열한다. 수술은 15~30개이며 수술은 짧고 화반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심피는 5개가 합생하며 화주는 분리되고 상위 자방 구조이다. 양지를 좋아하지만 음지에서도 잘 적응하며 가뭄이나 추위에 강하고 척박한 토양에도 잘 적응하지만 비옥하고 습윤한 토양을 좋아한다. 하지만 침수는 싫어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새순이나 꽃망울을 봄나물로 식용하며 근피와 지피를 간을 보호하고 눈을 밝게 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약으로도 쓴다.
진주가침박달의 학명
현재 국제적으로는 가침박달속을 하나의 종으로 통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5개의 종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일단 여기서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그대로 파악하기로 한다. 그럼 비록 우리 자생종은 아니지만 가침박달속의 모식종이며 대통합 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진주가침박달부터 시작한다. 중국 하남성과 강소성 절강성과 강서성 등 비교적 온난한 중부 지역이 원산지인 진주가침박달의 학명 Exochorda racemosa (Lindl.) Rehder는 영국 출신으로 미국 식물학자이자 20세기 최고의 식물채집가인 어네스트 윌슨(1876~1930)이 1907~1908년 그리고 1910년 중국에서 채집한 식물 표본을 정리하면서 미국 하버드대학 아놀드수목원의 Alfred Rehder(1863~1949)교수가 명명한 것을 1913년 미국 하버드대학부설 아놀드수목원장이었던 Charles Sprague Sargent(1841~1927)박사가 출판하여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나중인 1912년에 발표된 학명이 1858년에 창설된 가침박달속 즉 Exochorda속의 모식종이 된 것은 이 학명이 가침박달속을 창설하였던 바로 그 영국 식물학자인 John Lindley(1799~1865)가 1847년 채진목속으로 분류하여 명명하였던 학명 Amelanchier racemosa Lindl.의 묘사를 그대로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존 린들리는 어네스트 윌슨 이전 또 다른 전설적인 식물채집가인 스코틀랜드 출신 Robert Fortune(1812~1880)이 1943년 중국에서 채집한 표본을 대상으로 명명한 것이다. 그는 1858년 가침박달속을 신설하면서 모식종을 Exochorda grandiflora Lindl.을 삼았는데 이 수종이 바로 그가 11년 전 채진목속으로 명명하였던 Amelanchier racemosa Lindl.과 동일한 종임을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하버드대 아놀드수목원에 의하여 이런 사정이 밝혀지면서 Exochorda grandiflora는 Exochorda racemosa의 이명으로 처리되었던 것이다. 종소명 racemosa는 총상화서라는 뜻이고 grandiflora는 꽃이 크다는 뜻이다. 그리고 속명 Exochorda는 외부(exo)에 줄(chorde)이 있다는 뜻으로 노출된 심피로 구성된 열매가 마치 태반에서 탯줄로 연결된 태아가 연상되어 그렇게 명명하였다고 존 린들리가 회고한 바 있다. 존 린들리 자신은 의사가 아니지만 초창기 식물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의사출신이라서 그런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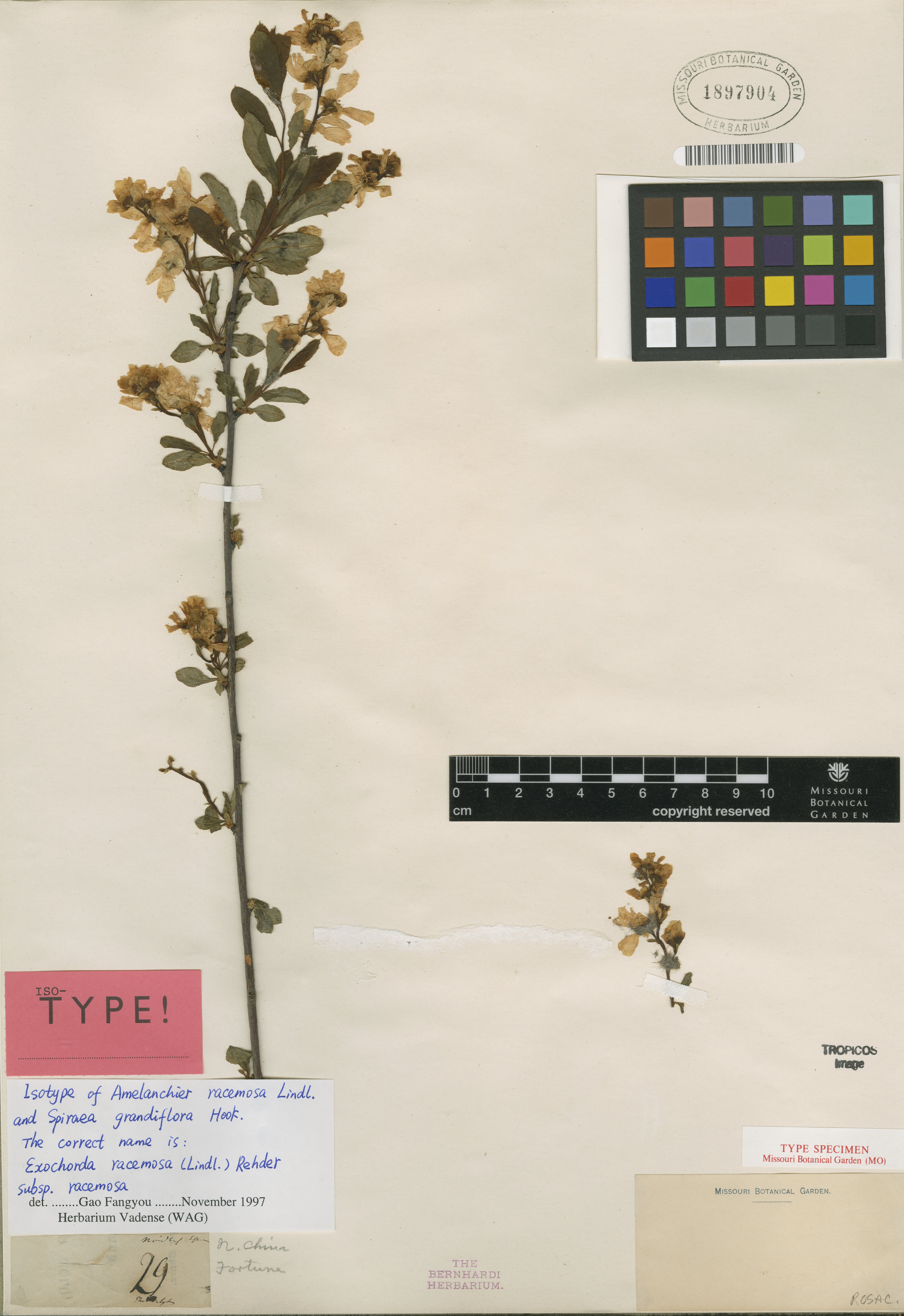



가침박달의 이름 유래
우리 자생종 가침박달은 1925년 정태현선생이 평남 맹산에서 채집한 표본은 남아 있는데 이상하게 1937년 발간된 조선식물향명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 후 1942년 정태현선생이 펴낸 조선삼림식물도설에 맹산지역의 방언이라며 가침박달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재된다. 가침박달 열매 모양이 특이하기에 속명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름도 열매의 모양에서 온 것이다. 5(6)개의 돌출된 능각이 모여서 거꾸로 된 원추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마치 바느질에서의 감침질을 연상시키기에 가침박달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가침은 이해가 되는데 박달이 왜 뒤에 붙었는가에 대하여는 시원한 풀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나무가 단단하여 박달이라고 붙였다고 하는데 키가 주로 2~3m 최대 5m까지만 자라는 관목인 가침박달 나무를 본 사람이라면 키가 무려 10~30m까지 자라는 대교목인 박달나무와 그 목재의 단단함을 비교한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전형적인 떨기나무 형태로 자라는 낮은 관목인 가침박달은 개화기에 보면 잎과 꽃만 보이지 겨우 손가락 만한 가늘고 연약한 줄기는 잘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목재의 단단함이 이 수종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떠올랐겠는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






박달나무는 한자로 단(檀)이라고 쓰는데 이 단(檀)을 우리나라에서는 엉뚱하게 자작나무속 박달나무를 뜻하는 한자로 쓰고 있지만 정작 중국에서는 다르다. 중국에서는 워낙 여러 사람이 다양한 나무를 지칭하는 용어로 썼기에 일정하지 않지만 주로 재질이 단단한 콩과의 황단나무(黄檀)나 자단향(紫檀) 그리고 느릅나무과의 청단(青檀)을 지칭하거나 향이 좋은 야자나무과의 백단향(檀香)을 지칭한다.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檀(단)이 뜻하는 자작나무과의 박달나무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전에는 단(檀)이 참빗살나무를 뜻한다고도 풀이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에서 화살나무속 소교목인 참빗살나무를 마유미(マユミ)라고 부르고 한자로 단(檀)이라고 쓰기 때문에 그런 풀이가 우리나라 사전에도 등재된 것이다. 바로 여기서 드디어 우리가 찾던 가침박달의 어원이 밝혀진다. 바로 참빗살나무의 열매가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자생하는 나무 중에서는 열매가 가침박달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만 참빗살나무(檀) 열매에 비하여 능각이 더 두드러지게 돌출하여 마치 재봉선 같은 이음새 모양을 하기 있기에 감침질한 박달나무(檀)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 이름은 자생지인 평남 맹산지역의 방언이 아니라 참빗살나무의 일본 이름이 박달(檀)이라는 것을 아는 정태현선생 등 식물학계 사람이 붙인 이름으로 보인다.





일본명 이휴매
어느 식물이던 처음 접할 때는 그 식물의 가장 뚜렷한 특징과 관련된 이름을 짓는 경우가 흔하다. 영국 학자 존 린들리가 명명한 진주가침박달 즉 Exochorda racemosa도 속명은 열매의 특징에서 온 것이며 종소명은 꽃차례의 특징에서 붙은 이름이라면 우리나라 가침박달은 열매에서 온 이름이다. 일본은 모식종인 진주가침박달이 결코 지나치지 않는 청초한 백색 꽃이 은은하게 피기에 다도를 즐기는 사람들의 정원수로 선호되었으므로 일본의 전설적인 다도(茶道) 시조(始祖) 중 한 사람인 천이휴(千利休, 1522~1591)의 이름을 따서 리큐바이(リキュウバイ) 즉 이휴매(利休梅)라고 부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주가침박달은 일본의 메이지시대(明治時代, 1868~1912) 말기에 도입되었으므로 천이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생종 가침박달의 경우는 일본에서 잎이 버드나무를 닮았고 꽃은 벚나무를 닮았다고 야나기자쿠라(ヤナギザクラ) 즉 유앵(柳桜)이라고 부른다. 아마 잎이 넓은 왕벚나무를 닮았다고 그런 이름으로 부른 것 같다.




중국정명 백견매와 별명들
원산지 중국에는 진주가침박달을 백견매(白鹃梅)라고 부른다. 여기서 견(鵑)은 두견새일 수도 있고 두견화일 수도 있다. 백색 매화를 닮은 꽃이 핀다고 중국의 저명한 식물학자인 진영(陈嵘, 1888~1971)선생이 1937년 발간한 중국수목분류학(中国树木分类学)에서 처음 붙인 이름이다. 그러므로 그 이전의 중국 문헌에는 당연히 백견매(白鹃梅)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메이지시대(明治時代, 1868~1912) 말기에 일본으로 건너가 이휴매(利休梅)라고 불리며 청초하고도 소박한 백색 꽃의 모습이 다도(茶道)와 매우 잘 어울려 다인(茶人)들에게 크게 사랑을 받자 원산지 중국에서 뒤늦게 관심이 높아져 과거 기록을 뒤져서 옛이름을 찾게 된다. 그래서 북송 진종조(真宗朝, 997~1022)에 궁중에서 군신들이 모여 잔치를 열며 응제시회(应制诗会)를 벌였는데 거기서 나온 다음과 같은 두 편의 시가 바로 진주가침박달을 대상으로 노래한 것이라는 것이다.
용백(龙柏) - 梅尧臣(매요신)
花非龙香叶非柏(화비용향엽비백)
独窃二美夸芳蕤(독절이미가방유)。
苦练不分颜色近(고련불분안색근)
紫荆未甘开谢迟(자형미감개사지)。
구양수와 더불어 송시의 개척자라는 매요신(梅尧臣, 1002~1060)이 쓴 위 시에서 용백화(龙柏花)가 바로 백견매라는 것이다. 용백화의 용백(龙柏)은 현재 중국에서 가이즈카 향나무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여기서 용(龍)은 용골을 의미하여 열매의 돌출된 능각을 말한다. 백(柏)은 큰 의미가 없이 그저 향나무 정도 크기의 관목이라는 뜻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매요신 자신도 위 시에서 향도 잎도 향나무는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회에는 북송의 저명한 문학가이자 사학가인 송기(宋祁, 998~1061)도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송기는 형 송상(宋庠, 996~1066)과 더불어 2송(二宋)으로 불리는데 형 송상은 1024년 진사과와 향시과 그리고 회시 등 세 개의 과거 시험을 모두 장원으로 통과하여 연중삼원(连中三元)으로 불리는 북송의 대신이자 문학가이다. 송기가 꽃과 동시에 덕을 칭송한 이 시에서 진주화(眞珠花)가 바로 백견매(白鵑梅)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현재 이름 진주가침박달과 일맥상통하는 이름이다. 물론 우리나라 이름 진주가침박달은 중국 고대이름 진주화에서 온 것이 아니고 영어 일반명 pearl bush에서 온 것이다. 가침박달은 정말 특이한 점이 많은 수종이다. 우선 열매가 5개의 돌출된 능각이 마치 별의 모습과 같이 구성되어 있어 식물에서는 비슷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특이하고 꽃도 그 가운데 둥근 화반(花盤)이 넓게 자리잡고 그 가장자리에 꽃잎이나 수술이 붙어 있어 다소 엉성한 듯한 모습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청초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그리로 무엇보다도 진주같이 생긴 꽃망울이 이 꽃의 진수가 아닌가 한다. 긴 총상화서에 진주구슬 같은 꽃망울이 달려있다가 아래서부터 하나하나 개화하는데 그 모습이 무척 아름답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영어로 Pearl bush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에서는 이미 송나라 때부터 진주화 또는 진주용백이라고 부른 기록이 있었던 것이다. 사람 생각이란 시대나 지역을 떠나서 어디나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주용백(真珠龙柏) - 송기(宋祁)
彼美夜光喻(피미야광유)
益之新甫名(익지신보명)。
累累云际艳(누루운제염)
皎皎月中英(교교월중영)。
勿诮素为绚(물초소위현)
相期隆德声(상기융덕성)。


남아 있는 그 당시 자료가 별로 없지만 아마 북송 황제 진종이 황궁 화원에 진주가침박달 즉 용백화를 심고서 본인이 먼저 시를 지어 읊고 그 화답으로 신하들이 시를 지어 바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복산자 영매(卜算子·咏梅)라는 매화관련 시를 쓴 중국 남송의 유명한 매화 시인인 육유(陆游, 1125~1210)는 본인은 용백화를 본 적이 없다고 언급한다. 그러니까 용백화라는 이름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육유의 고향인 절강성이 진주가침박달의 주 원산지 중 하나인데 못 봤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후인들이 찾아보니 양잠(養蠶)을 많이 하는 그 지역에서는 다른 이름인 견자화(茧子花)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즉 견화(茧花) 또는 견칠화(茧漆花)로도 불리던 견자화는 누에고치 꽃이라는 뜻인데 이 수종의 꽃망울이 마치 자투리 누에고치 같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양잠을 많이 하는 강남에서는 자투리 고치를 꿰어서 소녀들이 머리 장식으로 썼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북송시절 황궁에서 황제의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 그저 야생하는 잡목 꽃나무로 취급 받아 잊히고 있던 이 수종이 1800년대 말쯤 일본으로 건너가 거기서 의외로 크게 각광을 받자 중국에서는 북송 황궁 화원에서 사라진 꽃이 일본에서 이휴매로 환생했다며 표현하기도 했다. 北宋宫苑里消失的花(북송궁원리소실적화) 今生在日本转世成了利休梅吗(금생재일본전세성료리휴매마)? 중국에는 워낙 자생식물의 종류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침박달 정도면 가정의 정원수로는 그야말로 최상의 수종인데 이 수종이 대중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다가 일본에서 뜨자 뒤늦게 뿌리를 찾느라 부산을 떨었다는 말이다. 여하튼 원산지 중국 이름은 정명인 백견매는 꽃에서 온 것이며 별명인 진주화와 견자화는 꽃망울에서 온 것이고 용백화는 열매의 모양에서 온 것이다.
등록명 : 진주가침박달
학 명 : Exochorda racemosa (Lindl.) Rehder
분 류 : 장미과 가침박달속 낙엽 관목
원산지 : 중국 중부지역
중국명 : 백견매, 진주화, 견자화, 용백화 등
일본명 : 이휴매
영어명 : Pearl bush
수 고 : 3~5m
줄 기 : 세약, 개전
가 지 : 원주형, 미능각, 무모, 유시 홍갈색, 노시 갈색
동 아 : 3각란형, 선단둔, 평활 무모, 암자홍색
엽 편 : 타원형, 장타원형 장원도란형
잎크기 : 3.5~6.5 x 1.5~3.5cm
잎모양 : 선단원둔, 드물게 급첨 돌첨, 기부 설형 관설혈, 전연, 중부이상 둔거치
잎면모 : 양면 무모
잎자루 : 단, 5~15mm, 근무병
탁 엽 : 무
꽃차례 : 총상화서, 6~10송이, 무모
꽃자루 : 3~8mm, 기부 화경 정부화경 보다 약간 길다. 무모
포 편 : 소, 관피침형
꽃크기 : 지름 2.5~3.5cm
악 통 : 천종상, 무모
악 편 : 관3각형, 2mm, 선단급첨 혹 둔, 변영 첨예세거치, 무모, 황록색
화 판 : 도란형, 1.5 x 1cm, 선단둔, 기부 단조(爪), 백색
수 술 : 15~20, 3~4매씩 화반 변연 착생, 화판과 대생
심 피 : 5개
화 주 : 분리
열 매 : 삭과, 도원추형, 무모, 5 등마루(脊)
과 경 : 3~8mm
개화기 : 5월
결실기 : 6~8월
내한성 : 영하 31도


















'장미과 아몬드아과 > 가침박달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871 큰꽃가침박달 '더 브라이드' (2) | 2023.07.14 |
|---|---|
| 1870 가침박달 – 가장 아름다운 자생 꽃나무 중 하나 (2) | 2023.07.13 |
| 1869 코롤코위가침박달 – 진주가침박달에 통합 (1) | 2023.07.10 |
| 1868 윌슨가침박달 - 녹병백견매 (1) | 2023.07.10 |
| 1867 지랄드가침박달 - 홍병백견매(红柄白鹃梅) (1) | 2023.07.10 |